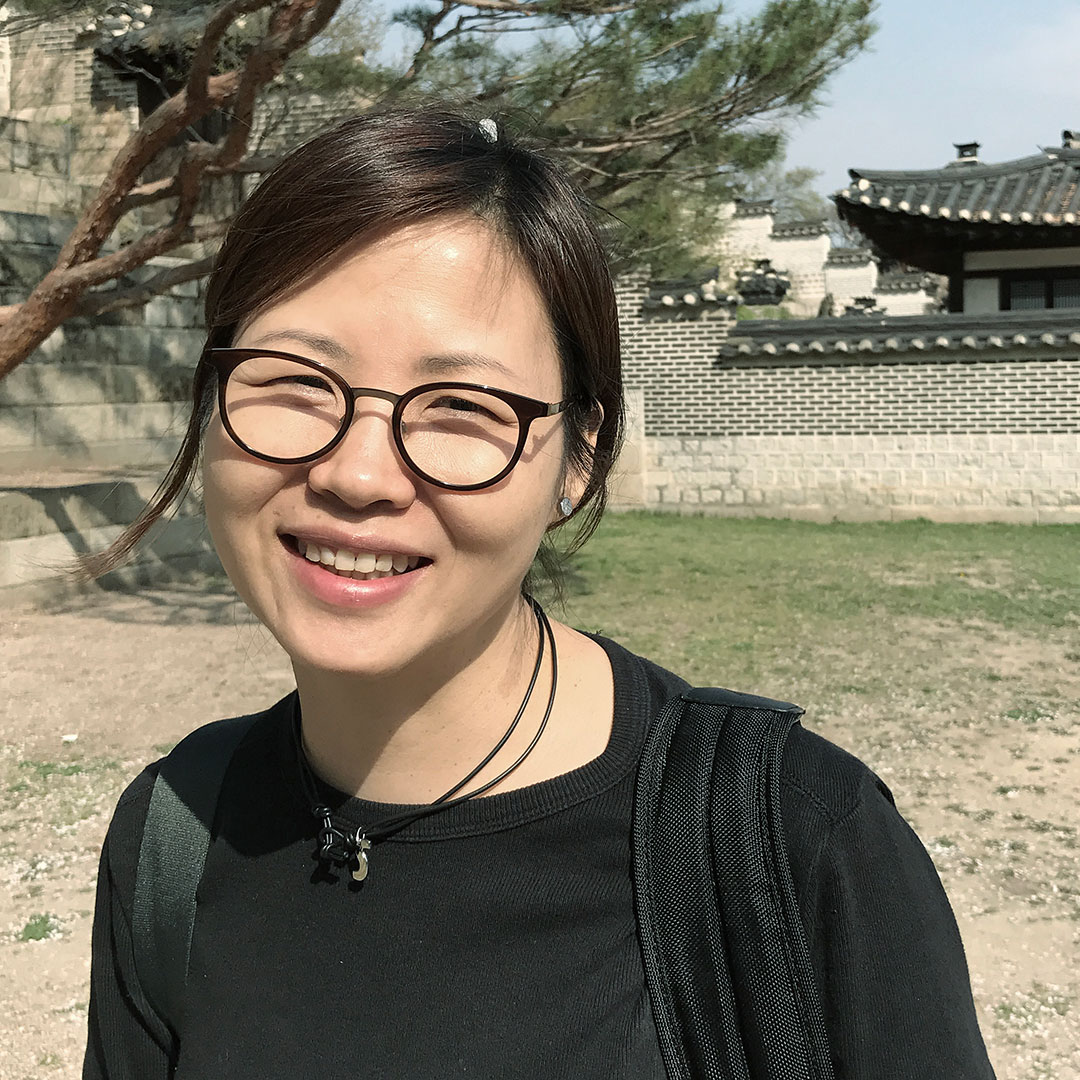감독 앙투안 베스 Antoine BESSE | France | 2024 | 102min | Fiction |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앙투안 베스 감독의 〈비상〉은 상실의 고통을 나누는 두 스케이트보더의 이야기를 다룬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과거를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동적인 점프 동작들과 함께 그린다. 또한 이 영화는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고 있을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상〉은 스케이트보드에 얽힌 당신의 유년 시절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랑드라는 곳에서 포장도로와 파도 사이를 오가면서 자랐다. 그곳 아이들은 하교 후에 바닷가나 동네 스케이트장에서 가서 노는 걸 당연한 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바다가 없는 곳으로 이사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그때의 좌절감으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놀이터를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골의 풍경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모든 포장도로에서 잠재력을 발견하려고 했다. 그리고 열네 살 때 래리 클라크가 연출한 〈키즈 Kids〉(1995)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영화가 담고 있는 1990년대 초 뉴욕의 스케이트보드 문화의 생생함과 심오함이 아직도 뇌리에 깊게 박혀 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2014년에 단편 〈모던 스케이트 Le skate moderne〉를 만들 수 있었다. 스케이트보더들에게 오래된 농부 옷을 입혀서 시골에 도시 문화가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려고 했던 작품이다.
작품 제목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원제인 ‘알리(ollie)’는 스케이트보드를 공중에 띄우는 기술에 해당한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프로듀서와 제목을 찾기 위해 오래도록 고민했다. 평소 한 단어로 된 제목을 좋아했다. 알리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처음 배우는 기술이자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기술이다. 그래서 영화 제목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영화 속 주요 인물인 피에르와 베르트랑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피에르와 베르트랑은 거울 이미지와 같다. 서로에게 반응하는 두 개의 고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베르트랑은 어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그는 과거에 갇혀 무언가에 중독된 채로, 그리고 후회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피에르는 어린아이지만 어른처럼 공정하고, 차분하고, 명석하다.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은 슬픔이다. 두 사람을 금지된 관계로 설정한 다음에 베르트랑을 나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뻔한 시선을 바꾸어 보려고 했다. 펑크족의 불안한 실루엣 뒤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었다. 베르트랑은 일탈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다. 피에르처럼 베르트랑도 슬픔에 마비되어 있다. 그런 두 사람이 스케이트보드에서 공통의 언어를 찾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
스케이트보드, 오토바이,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십 대들의 놀이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가 동시대의 청년 문화나 하위 문화를 다루는 것이었다고 봐도 될까?
그렇다. 젊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의 어린 친구들은 극장에 잘 가지 않는다. 영화가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영화가 보여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도 예술, 문화, 영화 분야에서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농촌의 전원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장면이 낯선 동시에 친근하게 다가온다.
나는 실제 그런 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들판에 몇 마리의 소가 있고, 닭이 뛰어다니고, 울퉁불퉁한 대지 사이로 콘크리트가 섬처럼 있는 그런 곳이었다. 콘크리트가 자연을 뒤덮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때의 느낌을 재발견하고 싶었다. ‘스케이트보드’하면 떠올리는 고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롱 숏과 슬로우 모션을 활용하거나 디지털 캠코더에 달린 어안 렌즈로 생생하고 우아한 움직임을 담으려고 했다. 스케이트보드는 하나의 ‘태도’이다. 그것은 젊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저항적인 몸짓이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그곳이 들판이건 빌딩 밑이건 간에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다.
헛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실제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영화를 위해 일종의 야외 세트로 만든 것인지 궁금하다.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영국의 전설적인 스케이트보더 톰 페니가 소유한 곳인데, 스케이트보더들 사이에서는 신화적인 장소다. 영화에서 보면 오래된 헛간에 미니 램프가 있고 그 가장자리에 냉장고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실제로 톰 페니가 그렇게 한 거다. 〈모던 스케이트〉에서도 헛간을 개조해서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하는 공간이 등장한다. 그 작품이 공개된 후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여러 스케이트보더가 “나도 헛간에 경기장을 만들었다”면서 연락을 주었다. 영화 속의 그 헛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여러 스케이트보더에게 바치는 일종의 헌사와 같은 것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모두 스케이트보드에 능하다. 배우 캐스팅은 어떻게 한건가?
스케이트보드 공동체는 속임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법 엄격해서 그 문화의 코드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 영화를 만들 때부터 대역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팀을 만들었다. 유일한 예외는 베르트랑을 연기한 테오 크리스틴이었다. 테오도 나름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 지역에서 전설적인 스케이트보더를 연기하려면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촬영 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말 운이 좋았다. 스케이트보딩의 최악의 적은 바로 비다. 스케이트보드와 관련된 모든 장면을 날씨가 좋을 때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촬영 중에 누군가 다친다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다행히 모두가 조심했고 또 수준급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덕분에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 스태프들은 배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특히 그들에게 촬영장 밖에서는 절대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말라고 당부했다.
당신의 작품은 상실의 고통이나 소외의 고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던 스케이트〉를 함께 만들었던 베랑제라는 친구가 2020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리고 어릴 적 폭력적인 상황을 많이 보면서 자랐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그런 이야기를 보여 주고 관객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작품은 치유에 관한 것이다. 또한 고통, 상실, 소외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평소 소외된 공동체나 사회 주변부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나는 영화가 친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보편적인 무언가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이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