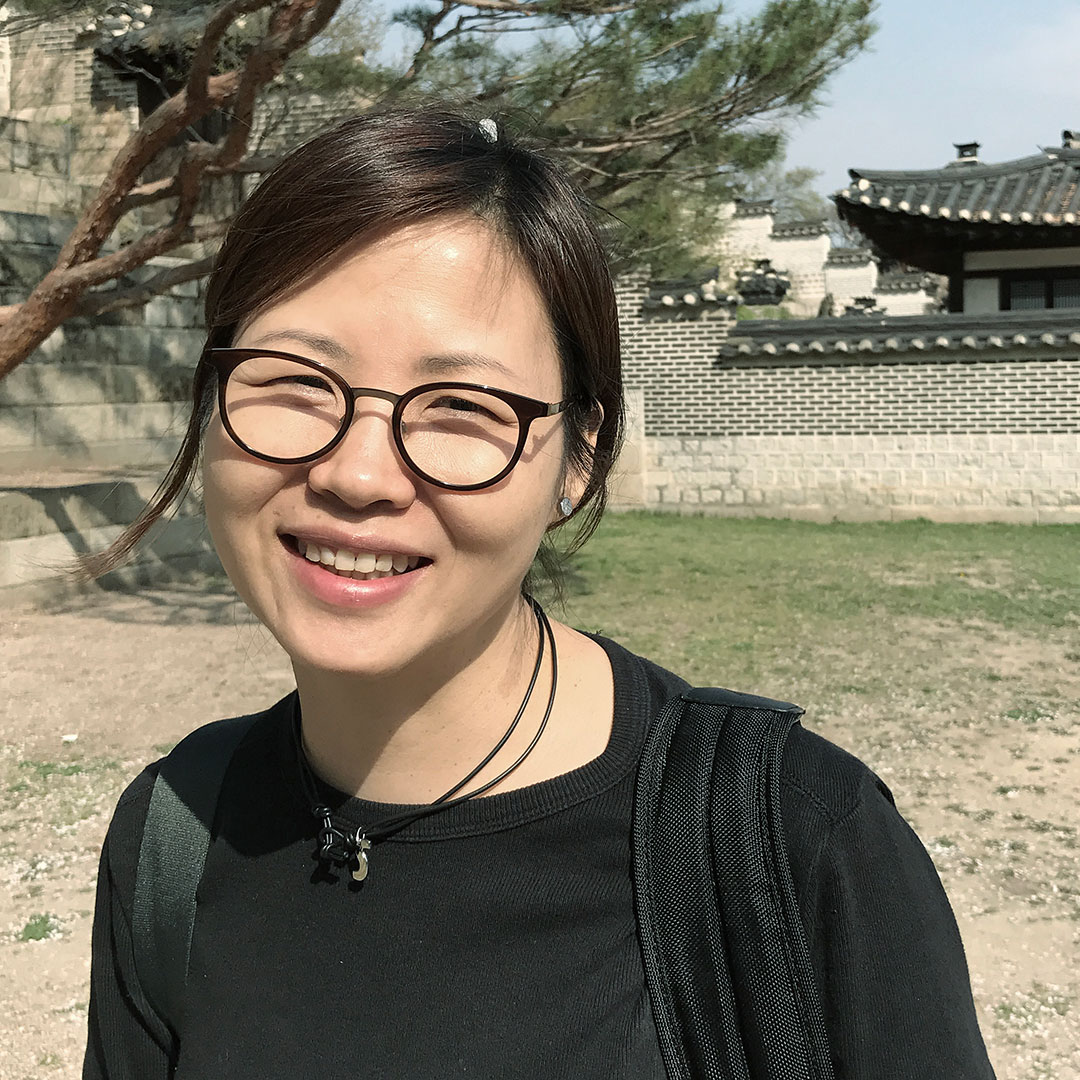France, Korea, Germany | 2022 | 67min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영화로 1막은 세계 최대의 꽃시장을 촬영한 관찰 다큐멘터리, 2막은 피란델로의 희곡을 각색한 픽션이다.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기차역 카페에서 낯선 이를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성찰을 그리고 있다.
〈레터즈 투 맥스〉 〈지하디로 알려진〉 〈드라마틱 필름〉을 통해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어온 에리크 보들레르는 최근작 〈입 속의 꽃잎〉에서 이 둘을 나란히 병치시킨다. 말을 지우고 움직임에 집중한 전반부와 말로 쌓아가는 드라마를 관찰할 수 있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다른 듯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입 속의 꽃잎〉의 전반부는 꽃 시장을 관찰한 다큐멘터리, 후반부는 루이지 피란델로의 희곡 「입에 꽃이 핀 남자」(1922)를 각색한 픽션이다.
피란델로의 희곡은 불치병에 걸린 남자가 낯선 이를 만나는 기차역 카페가 주요 배경이다. 주인공이 자주 찾는 그곳에 도시에서 하루를 보내고 시골로 돌아가기 위해 아침 기차를 기다리는 낯선 이가 있다. 한편 주인공은 그곳에서 지난 시간을 반추하며,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란 걸 인식한 채로 주변 삶을 관찰한다. 나는 이 희곡을 현재에 맞게 각색하기 위해 관찰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나란히 둔 두폭화 구조를 떠올렸다. 1막은 네덜란드 알스메이르에 있는 꽃 시장의 광적인 리듬을 담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서곡은 밤에 펼쳐지는 매우 사적인 2막의 무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1막의 다큐멘터리가 말 없이 시각과 청각적 감각에 고정돼 있다면, 카페에서의 긴 대화를 담은 2막의 픽션은 언어의 몰입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옥스모 푸치노가 연기하는 주인공과, 달리 벤살라가 연기하는 낯선 남자는 초면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견 사소해 보이는 대화 안에 언어, 죽음, 현실 관찰에 관한 생각들이 녹아 있다. 꽃을 입에 문 남자는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해 말하고, 또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맹렬한 욕구를 갖고 있다.
영화가 시작되면 세계 최대 화훼시장의 풍경이 특별한 대사나 내레이션 없이 펼쳐진다. 꽃 시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꽃 공장’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꽃과 노동하는 이의 모습을 주요하게 비추는데. 꽃, 특히 화훼시장을 소재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 첫 부분은 바티칸 정도 규모의 냉장 설비가 된, 유럽에서 가장 큰 작업 구조물(꽃 시장)을 배경으로 한다. 아프리카와 남미 등지의 농장에서 매일 아침 4600만여 송이의 꽃들이 이곳으로 날아와 팔리는데, 이 과정에서 꽃들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1936)의 21세기 버전을 떠올리게 할 만큼의 컴퓨터 제어 기계화 과정을 거친다. 꽃은 아름답기에 매혹적이고 동시에 현재의 생태학적 이상(異常)을 상징하고 있기에 무섭기도 한데, 그 과정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나는 아름다운 동시에 추한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런 점에서 꽃 시장이라는 장소가 내 눈길을 잡아당겼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2019)의 촬영감독이기도 한 클레르 마통과 함께 촬영을 진행해가면서 우리는 이곳 노동자들이 마치 영화 속 등장인물인 것처럼 그들을 긴 트래킹 숏에 담기로 결정했다. 또한 편집감독인 클레어 애서턴과의 상의를 통해 각 시퀀스에 시간성을 부여해 우리가 이 과정의 리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장소에 물리적 감각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수많은 희곡 중에 피란델로의 작품을 골랐다. 어떤 부분을 강조해 담고 싶었나.
「입에 꽃이 핀 남자」는 질병, 그리고 ‘은유적’ 질병에 관한 작품이다. 즉, 살아 있는 한 존재가 세계와의 관계를 재고(再考)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로서 죽음의 확실성과, 아름다움과 파멸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구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면에 서 은유로서의 질병을 담고 있다. 희곡에서 말하는 입가에 핀 꽃은 피란델로가 살던 시대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종양의 일종인 ‘상피종’을 뜻한다. 그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직후에 이 희곡을 썼다. 나는 1990년대에 이 글을 발견했는데, 당시에는 에이즈에 관한 영화로 각색하고 싶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20여 년이 걸렸고, 당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이 프로젝트에 또 다른 차원의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현실이 텍스트를 따라잡을 때마다 그것이 가진 문학적, 그리고 철학적 깊이는 순간순간의 뉴스와 비극을 초월하게 했다. 이 영화는 질병과 죽음을 넘어선, 삶에 대한 영화이다.
당신의 영화 작업은 늘 경계 위, 혹은 경계 바깥에 위치하는 듯하다. 가령 전작 〈레터즈 투 맥스〉의 경우 다큐멘터리 형식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다큐고 어디서부터 픽션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두 형식이 충돌한다. 당신에게 영화 형식(혹은 영화언어)이란 무엇인가.
나는 픽션과 다큐멘터리 형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보통 한 영화 안에서 이 두 방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영화를 만들어왔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달랐다. 〈입 속의 꽃잎〉은 대상의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는 순수한 현실 관찰로 영화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순수한 조작, 즉 글로 쓰인 대화, 연기, 미장센으로 구성했다. 내가 늘 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대치하는 형태로, 이 두 문제에 대면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에리크 보들레르
1973년 출생.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둔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이다. 장편영화 〈어글리 원 The Ugly One〉(2013), 〈레터즈 투 맥스 Letters to Max〉(2014), 〈지하디로 알려진 Also Known As Jihadi〉(2017), 〈드라마틱 필름 Un lm dramatique〉(2019)은 로카르노, 토론토, 로테르담 등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2019년 전시 ‘여유를 가지세요’(Tu peux prendre ton temps)로 마르셀 뒤샹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