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은 루마니아 출신의 시네아스트, 라두 주데의 신작 〈콘티넨탈 ’25 Kontinental ’25〉이다. 2002년 TV 시리즈 〈가족 안에서 In familie〉로 연출 경력을 시작한 라두 주데는 이후 20여 년이 넘는 동안 다양한 길이, 장르, 여러 종류의 촬영 장비를 동원해 약 30편의 작품을 만들었다. 긴 시간, 성실하게 영화를 찍어 온 감독답게 올해 전주에서는 최근작 〈콘티넨탈 ’25〉와 함께 2024년 작 〈잠 #2 Sleep #2〉를 선택, 관객과 만날 기회를 마련한다. 두 영화에서 눈여겨볼 것은 전자가 100%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화이고, 후자가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무덤을 비추는 라이브캠 푸티지를 자르고 붙여 만든 ‘데스크톱 영화’라는 점이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지만 지난 역사의 기록을 현시점에서 재해석해 내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은, 이 시대의 작가 라두 주데에 대해 알아본다.
2006년 첫 단편을 내놓은 후 20년 동안 라두 주데 감독은 약 30편의 작품을 만들었다. 5분이 채 안 되는 초단편부터 3시간에 달하는 장편까지, 일반적인 극영화와 아카이브를 활용한 다큐,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실험영화까지, 다산성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의 필모그래피가 보여 주는 다양성과 스펙트럼이다. 관객의 선입관을 넘어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화 매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라두 주데는 그 행보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러기에 매력적이며 언제나 기대되는 시네아스트다.
라두 주데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대 초 세계 영화계에 강한 인상을 남긴 ‘루마니아 뉴웨이브’부터 시작해야 한다. 21세기와 함께 새로운 루마니아 영화가 등장했는데 이 영화들은 차우셰스쿠 독재 시기(1965~1989)의 사회주의적 프로파간다와 결별하고, 혁명 이후인 1990년대 루마니아 영화의 은유적 방식과도 거리를 두었다. 삼십 대의 젊은 감독들이 이끈 뉴웨이브 작품들은 리얼리즘에 기반해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고, 그 시작은 크리스티 푸이우 감독의 〈길 위의 비즈니스 Stuff and Dough〉(2001)였다. 이후 그는 〈라자레스쿠 씨의 죽음 The Death of Mister Lazarescu〉(2005)으로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이때부터 루마니아 영화의 국제영화제 수상이 이어진다. 코르넬리우 포룸보이우의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12:08 East of Bucharest〉(2006)는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을 받았고, 다음 해 크리스티안 문쥬의 〈4개월, 3주... 그리고 2일 4 Months, 3 Weeks and 2 Days〉(2007)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은 거대한 사건이었으며, 2010년대 초까지 루마니아 영화들는 전 세계 영화제의 중요한 게스트가 되었다. 라두 주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The Happiest Girl in the World〉(2009)를 내놓은 것도 이 시기였다. 동시대 뉴웨이브 영화들의 리얼리즘 미학을 공유하면서도 특유의 서사적 실험을 시도한 이 작품은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선댄스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그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표면과 심층 사이, 끝없는 영화 투쟁의 역사
라두 주데는 1977년 부쿠레슈티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영화적 시작점에 대해 2020년에 연출한 단편 〈나는 모른다 I Don’t Know〉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영화감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혁명 이후에 생긴 시네마테크 덕분이 아닌가 싶다. 그곳은 부쿠레슈티의 젊은이들에겐 기적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십대 때 마니아의 시절을 보낸 그는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후 코스타 가브라스의 〈아멘 Amen.〉(2002) 연출부로 현장 경험을 시작했고, 2006년 첫 단편 〈모자를 쓴 튜브 The Tube with a Hat〉를 내놓았다. 루마니아 영화사상 가장 성공한 단편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선댄스를 비롯해 10여 개의 영화제에서 수상했는데, 네오리얼리즘의 걸작 〈자전거 도둑 The Bicycle Thief〉(1948)과 비교되었다.
두 번째 단편 〈알렉산드라 Alexandra〉(2006)로 오버하우젠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입지를 다진 그는 첫 장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를 내놓는다. 델리아라는 소녀가 우연히 경품 행사에 당첨되면서 겪는 하루 동안의 고된 경험을 담아낸 영화는 비전문 배우를 주인공으로 기용하고, 시네마 베리테 스타일을 통해 롱 숏을 강조하고 현장음을 주로 사용한다. 관객을 극적으로 몰입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의를 분산시키는 이 영화의 독특한 리얼리즘은 향후 라두 주데 영화의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후 그는 정박하지 않고 끊임없이 모색한다. 〈친구들을 위한 영화 A Film for Friends〉(2011)는 한 시간 가까이 하나의 신으로 전개되는데 부조리하면서도 충격적이다. 그리고 〈아페림! Aferim!〉(2015)은 그가 루마니아 뉴웨이브의 미학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작품이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19세기 루마니아를 흑백 화면에 담아내는, 일종의 역사적 각성과 반성의 영화다.
그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 과거의 사실들을 가감 없이 냉철하게 드러내는데, 그 작업은 〈상처입은 마음 Scarred Hearts〉(2016, 로카르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데드 네이션 The Dead Nation〉(2017), 〈나는 야만의 역사로 거슬러 가도 상관하지 않는다 I Do Not Care If We Go Down in History as Barbarians〉(2018, 카를로비바리영화제 그랑프리), 〈열차의 출구 The Exit of the Trains〉(2020)까지 이어진다. 특히 그는 나치와 연합해 홀로코스트에 참여했던 루마니아의 야만적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 연장선상에 있는 현실을 바라본다. 〈어퍼케이스 프린트 Uppercase Print〉(2020)가 바로 그런 작품이다. 독재자 차우셰스쿠에 도시 곳곳에 낙서를 하며 저항하던 소년이 결국 체포되어 비밀경찰의 심문을 받는 이야기다.
베를린국제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한 〈배드 럭 뱅잉 Bad Luck Banging or Loony Porn〉(2021) 역시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 작품일 것이다. ‘리얼리즘’과 ‘역사’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전진했던 그의 작품 세계는 이 영화를 통해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논란과 논쟁의 세계로 나아간다. 파편적인 서사와 하드코어한 표현과 극도의 풍자가 결합된 〈배드 럭 뱅잉〉은 위선적인 사회에 대한 언급을 넘어 관객에 대한 공격과도 같은 영화였다.
이후 그의 영화는 매체적 실험을 확장한다. 로카르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너무 큰 기대는 말라 Do Not Expect Too Much from the End of the World〉(2023)는 거친 다큐 스타일의 흑백영화에 틱톡 화면을 결합하고, 여기에 4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의 화면을 교차 편집한다. 〈잠 #2 Sleep #2〉(2024)은 앤디 워홀에 대한 오마주이자 패러디이며, 〈낙원에서 온 여덟 장의 엽서 Eight Postcards from Utopia〉(2024)는 광고 필름으로만 이뤄진 컴필레이션 다큐멘터리다. 그리고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각본상을 받은 〈콘티넨탈 ’25〉는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었다.
라두 주데 감독에게 중요한 것은 이야기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론이며, 그것을 위해 이미지에 대한 영화사 초기의 경험과 정치적 담론과 현실의 모순과 역사의 기록을 끌어온다. 단편 〈나는 모른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영화의 소재를 어떻게 찾는지 묻는다면, 난 잘 모르겠다. 카메라로 포착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아마도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에 관심 있을지 모르겠다.” 그의 영화는 표면과 심층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며, 영화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것에 도달하려는 쉼 없는 여정인 셈이다.
© Silviu Ghetie

콘티넨탈 ’25 Kontinental ’25 감독 라두 주데 Radu JUDE | Romania, Switzerland, Luxembourg, Brazil, United Kingdom | 2025 | 109min | Fiction | 개막작 Opening Film
딜레마를 바라보는 날 선 시선
리뷰 〈콘티넨탈 ’25〉
오르솔랴는 불법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집행관이다. 보일러실에 살고 있는 한 노숙자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는 깊은 죄책감에 빠진다. 이후 그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난다. 〈배드 럭 뱅잉 Bad Luck Banging or Loony Porn〉(2021)이나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너무 큰 기대는 말라 Do Not Expect Too Much from the End of the World〉(2023) 같은 과격한 작품으로 라두 주데의 세계를 접했던 관객이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그의 신작 〈콘티넨탈 ’25〉가 조금은 차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영화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실험적이며 거침없이 현실을 파고든다.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유로파 ’51 Europe ’51〉(1952)과 앨프리드 히치콕의 〈싸이코 Psycho〉(1960)에서 영감을 받은 〈콘티넨탈 ’25〉는 전자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구원을 갈구하는 여성에 대한 영화이자, 후자처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관점이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서사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영화에서 오르솔랴는 선량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지구촌의 수많은 문제에 민감하며 여러 단체를 후원하는 자선가다. 하지만 고급 호텔 재건축을 위해 노숙자를 몰아내야 하는 그의 직업은 딜레마를 만들어 내는데 주인공은 ‘나쁜 일을 한 착한 사람’이 되어버린 셈이며, 그는 이러한 역설에서 벗어나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 한다. 그래서 직장 상관부터 친구, 어머니 등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진 못한다. 대신 영화는 단조로운 롱테이크 대화 신을 통해 낯설면서도 건조하게 현실을 폭로한다. 점점 깊어지는 빈부 격차,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자본주의와 파시즘... 영화는 수많은 사회적 모순들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구촌 전체가 겪고 있는 증상이다. 여기에 가자 지구 학살과 우크라이나 전쟁, 다양한 빈곤 이슈까지 영화는 작정한 듯 우리 시대의 비극을 늘어놓는다.
이처럼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라두 주데 감독은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특유의 유머 감각을 포기하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을 파고드는 첨예한 이야기지만 〈콘티넨탈 ’25〉는 일종의 부조리극 혹은 풍자 코미디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자신이 연루된 끔찍한 일을 반복해 이야기하면서 과잉된 죄의식에 빠지는데, 관객은 그 모습을 점점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호들갑으로 느끼게 된다. 하지만 라두 주데의 카메라는 비난하거나 비꼬며 희화화하지 않는다. 감독은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올바름의 관점으로 인물을 재단하지 않고, 한 개인이 경험하는 개별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런 곤란한 상황과 일상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되묻는다. 통렬한 대목이다.
도시를 떠돌던 오르솔랴는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난다. 오래전 로마법 수업을 들었던 그는 여전히 한 구절을 외우고 있다. “올바르게 사는 것.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이것이 법의 계명이다.” 진리는 이토록 명료하고 상식적이지만,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가. 〈콘티넨탈 ’25〉는 자본의 논리로 점점 카오스가 되어 가는 세상에 대한 날 선 시선이며, 섬세하고 예리하게 포착된 풍경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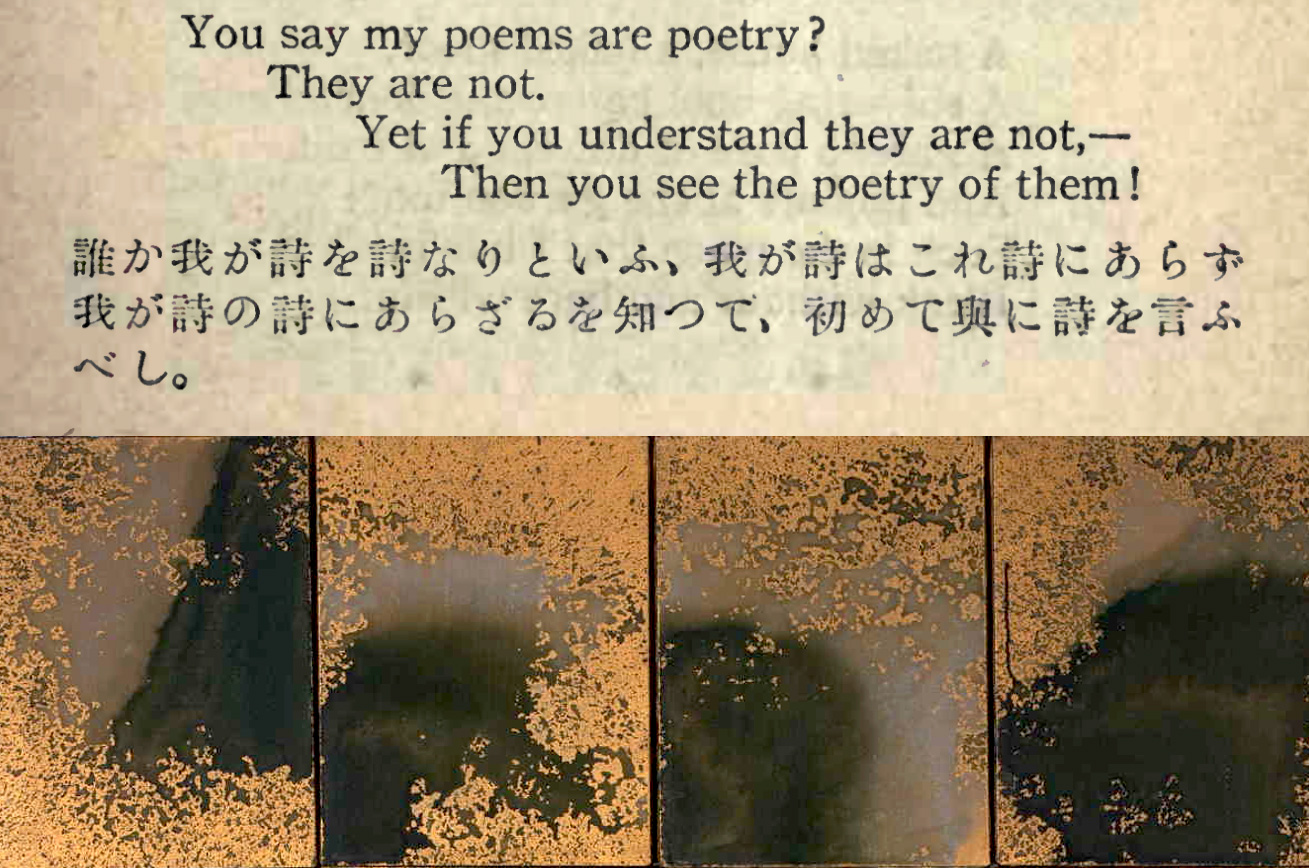
있던 것을 재정의하기
리뷰 〈잠 #2〉
“산다는 것의 가장 멋진 점은 죽는다는 것이다”라는 앤디 워홀의 말로 시작하는 영화는 처음에 워홀의 죽음을 기리는 엄숙한 애도의 작업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만큼 지루할지도 모른다는 느낌과 함께... 그러나 곧 워홀의 묘비 주변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동물들, 바람과 그에 날리는 풀들, 낮의 다채로운 빛과 밤의 (역시) 다채로운 어둠이 영화를 다양한 갈래로 분화시킨다. 때로 이 영화는 묘지 옆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캠벨 수프 통조림을 묘비 위에 올려놓고, 은발 가발과 선글라스로 워홀 분장을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등의 일상을 관찰하는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때로는 으스스한 괴기영화나 실험영화처럼도 보이는데, 라이브캠의 낮은 화질과 밤의 어둠이 묘비 옆 수풀을 괴생명체처럼 꿈틀거리게 보이게끔 만들거나 종종 ‘깨진’ 화면들이 역설적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자아낼 때 그러하다.
제목이 시사하듯, 이 영화를 워홀의 〈잠 Sleep〉(1964)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워홀이 〈잠〉을 촬영하며 연인 존 지오르노의 수면 상태를 오랜 시간 관찰했다면, 주데의 〈잠 #2〉는 워홀의 묘비와 주변 풍경을 1시간 내내 화면에 담아냄으로써 워홀의 ‘영원한 잠’을 관찰한다. 지오르노의 죽음과 같은 잠과 워홀의 잠과 같은 죽음 사이에서 두 작품이 취하는 관찰의 방법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전자의 관찰이 카메라를 든 자의 ‘직접 관찰’이라면, 후자는 24시간 라이브캠이라는 탈인간적 장치를 통해 ‘간접 관찰’된 것을 재조합한 결과다. 화면에 등장하는 라이브캠 사이트의 워터마크, 갑자기 나타나는 맥북의 볼륨 창, 화면 캡처 동작과 관련된 시각적 요소들은 이 영화가 카메라가 없는 영화, 혹은 감독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화임을 드러낸다. 주데는 직접 촬영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영상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고르고 배열함으로써 24시간 라이브캠의 탈인간적 결과물에서 다른 시간과 의미를 발굴해 낸다. 이는 워홀이 기성품을 예술로 전환했던 방식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워홀이 슈퍼마켓에서 파는 캠벨 수프 통조림을 예술로 끌어들인 것처럼, 주데는 공개된 라이브캠 영상을 예술적 구성의 재료로 삼는다. 둘 모두 예술이 반드시 새로 촬영한 이미지나 새롭게 제작한 오브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시 배열하고 바라보는 방식으로도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전유의 사례인 것이다.
언뜻 정적이고 (그래서) 진지하고 실험적인 예술의 겉모습을 뒤집어 쓴 듯한 이 영화는 기대와는 다르게 실험적 예술의 장소가 되지 않는다. 마치 워홀의 묘지가 엄중한 애도의 장소가 되기보다는 관광 명소, 예술적 순례지, 소풍 장소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주데는 라이브캠이라는 탈인간적 장치를 통해 죽은 예술가의 묘지를 관찰하면서도, 그 풍경 안에서 삶의 기척과 유머, 우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해 낸다. 화면 속에서 워홀은 땅속에 묻힌 채 영면해 있지만,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과 동물들,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반쯤 내보인 채 무덤 앞에 선 사람의 우스꽝스러움이나 어미와 새끼 사슴의 나들이에 담긴 정겨움 등은 살아 있는 애도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출난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범상한 우리 자신의 살아 있음임을 조용히 깨닫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