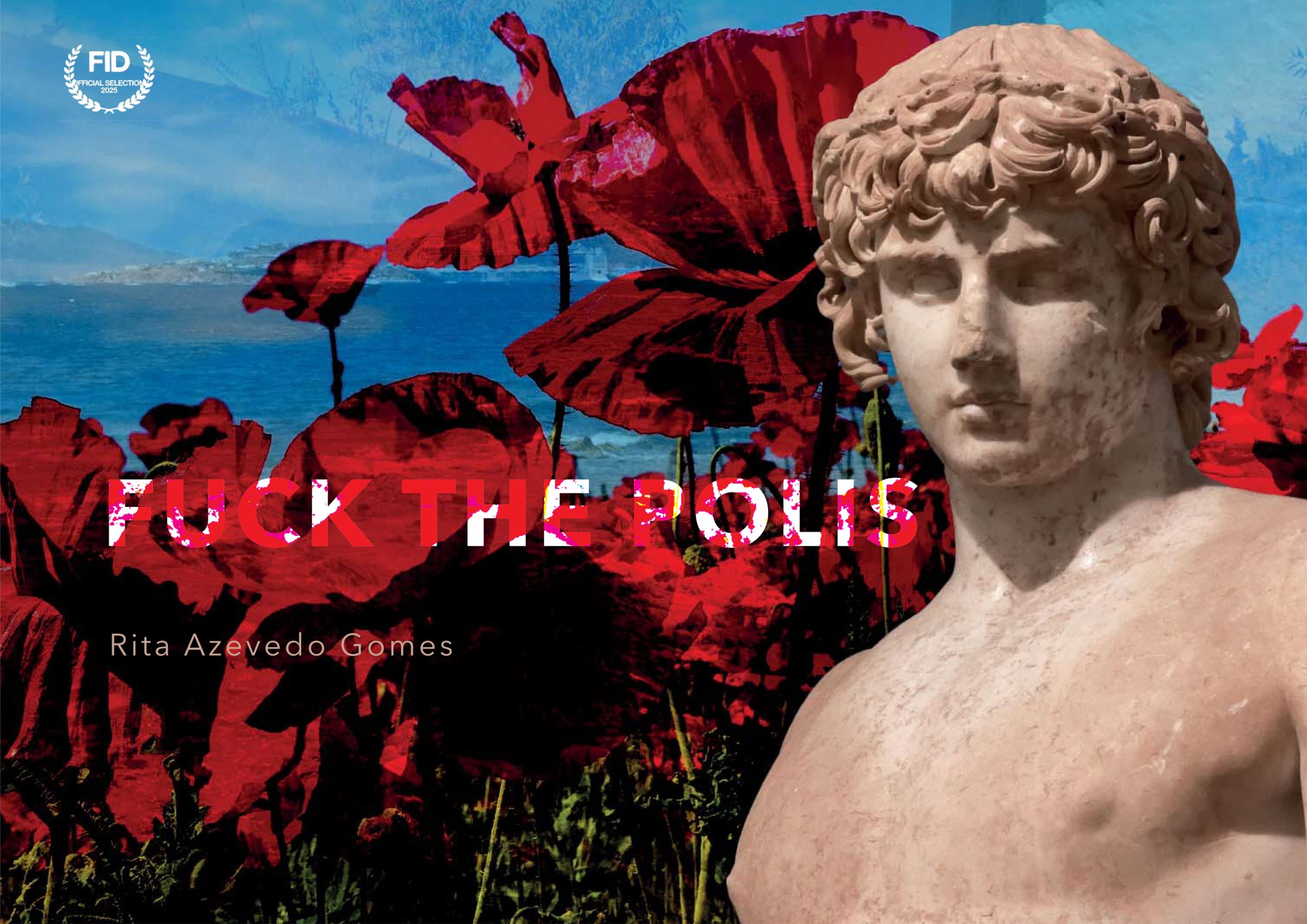© Fabian Gamper / Studio Zentral
감독 마샤 쉴린스키 Mascha SCHILINSKI | Germany | 2025 | 149min | Fiction
역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침투하는 살아 있는 힘이다. 독일 북부 알트마르크 지역의 한 농장을 배경으로 1910년대, 194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10년대를 관통하는 마샤 쉴린스키 감독의 영화 〈사운드 오브 폴링〉이 속삭이는 바다. 네 세대에 걸친 여성들의 경험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집합을 이룬다. 각기 다른 시간의 층위를 시각적, 감정적 유사성에 힘입은 몽타주로 직조해 공동의 경험으로 확장해내는 편집술에 기반하고 있으나, 쉴린스키의 영화는 결정적으로 교차편집의 전형적 용례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창적인 내면성을 성취해낸다.
한 소녀가 목발에 의지해 외다리로 집 안의 어두운 복도를 걸어다닌다. 우리는 곧 치마 아래 쪽에 끈으로 칭칭 동여맨 나머지 한쪽 다리를 보게 된다. 목발은 위층 작은방에서 밤마다 사라진 다리의 환상통에 시달리며 비명 지르는 프리츠 삼촌의 것이다. 소녀는 장애에 대한 은밀한 환상을 품은 대가로 곧 아버지에게 잔혹하게 뺨 맞는다. 때는 1940년대, 에리카는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 속에 놓인 십 대다. 그리고 영화는 불시에 시간의 물살을 갈라 1910년대를 살아가는 어린 알마의 호기심에 다가간다. 일찍이 죽은 자매가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다게레오타입의 사후 초상화에 매혹되어 시체와 같은 자세를 흉내 내는 놀이에 몰두한다. 닫힌 방에선 히틀러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 부모에 의해 불구가 된 형제가 신음하고 있다. 〈사운드 오브 폴링〉을 압축하는 으스스한 서곡 역할을 하는 이 도입부는 에리카와 알마, 불구가 된 남자들과 죽은 여자들, 가부장적 폭력의 주체들을 정체불명의 얇고 연한 막 위에 겹쳐둔다.
다중 화자의 시간을 모자이크하는 구조는 이후 더욱 대담해진다. 1980년대의 사춘기 소녀 안겔리카는 로맨스로 가장된 근친 성폭력을 겪으면서 자기 부정의 고통을 겪는 중이고, 유일하게 21세기를 사는 렌카는 낡은 집을 개조하려는 중산층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한 이웃 소녀와 가까워진다. 영화의 시점이 현대로 들어서면서 인물의 계층·계급적 인식도 주요한 의제로 자리 잡는다. 예고나 경고 없이 시간을 앞뒤로 오가는 편집, 열쇠 구멍과 마루판 사이로 훔쳐보는 듯한 카메라의 시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오래된 집의 벽을 타고 진물처럼 흘러나온 집합적 의식이 인물들을 전염시키는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쉴린스키는 “100년간의 홈비디오가 가족의 유령들에 의해 촬영된 것 같은”(칸영화제 공식 인터뷰) 영화를 만들었다. 유령의 그것에 비견되는 통시적 응시의 장치는 디제시스1 안팎에 포진해 있다. 일종의 귀신 들린 집인 서사적 무대, 겹치고 스며드는 탐미적 화면 전환, 부서질 것 같은 침묵과 이를 뒤덮는 웅웅거리는 음향 효과,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결속시키는 일기체의 보이스 오버 등이다. 이런 특성들의 결합은 시적이거나 명상적이라는, 비선형적 영화에 흔히 주어지는 수식을 다소 무력하게 만든다. 차라리 호러 장르의 스타일과 비견할 만하다. 마샤 쉴린스키는 미국 사진작가 프란체스카 우드먼의 작품을 영감의 출처로 밝히고 있는데, 낡고 텅 빈 실내에서 여성의 몸을 초현실적인 구도와 자세로 연출하고 흐릿한 형태로 배경과 이중인화해 몸이 마치 사라지고 있는 듯한 작품들이 심령 사진을 연상시킨다. 감각적 차원에서 종합하자면 〈사운드 오브 폴링〉은 인물과 시공간, 육체와 혼령, 쇼트와 쇼트가 빙의하는 움직임의 영화라고 말하고 싶다. 빙의된 영화는 직선적이고 거시적인 역사관 아래 소거되어 온 여성의 슬픔을 분열된 목소리로 발화한다.
인과율이 아닌 특정한 정신 상태로의 수렴을 강조하는 〈사운드 오브 폴링〉의 시간성을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한 여성적 시간에 빗대어 보아도 좋겠다. 이 개념을 빌리자면 〈사운드 오브 폴링〉이 이루는 섬세한 태피스트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정치적 조건을 초월하는 ‘기념비적 시간’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사운드 오브 폴링〉에서 나치 권력의 흥망성쇠를 따라 전개되는 한 가족의 15시간짜리 대서사시인 에드가 라이츠 감독의 〈헤이마츠〉(1984)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작은 농촌 마을로 향하는 미하엘 하네케의 〈하얀 리본〉(2010)에 응답하려는 야심을 읽어내려는 시도 또한 무리는 아닐 것이다.
훌륭한 영화는 낡은 현실을 구원하려 애쓰다가 불시에 그것을 넘어선다. 이런 영화들을 통해 영화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매체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 그리고 훼손된 주체성을 재구성하는 도구임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사운드 오브 폴링〉은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거나 현재를 과거에 덧대보는 것이 아니라 네 겹의 시간대를 거대한 동시성 속에 풀어놓는다. 그러자 한 세기가 이곳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쌓인다. 우울과 소멸의 충동에 사로잡힌 십 대의 일기장과 역사적 트라우마의 전승 현장은 하나이고, 마샤 쉴린스키의 영화에서는 잠시 영원에 모인다. 모두 지금–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 Fabian Gamper / Studio Zentral
-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 속 시공간 또는 가상의 인물들이 살고 있는 허구화된 세계를 이르는 말. 등장인물이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자막이나 배경 음악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