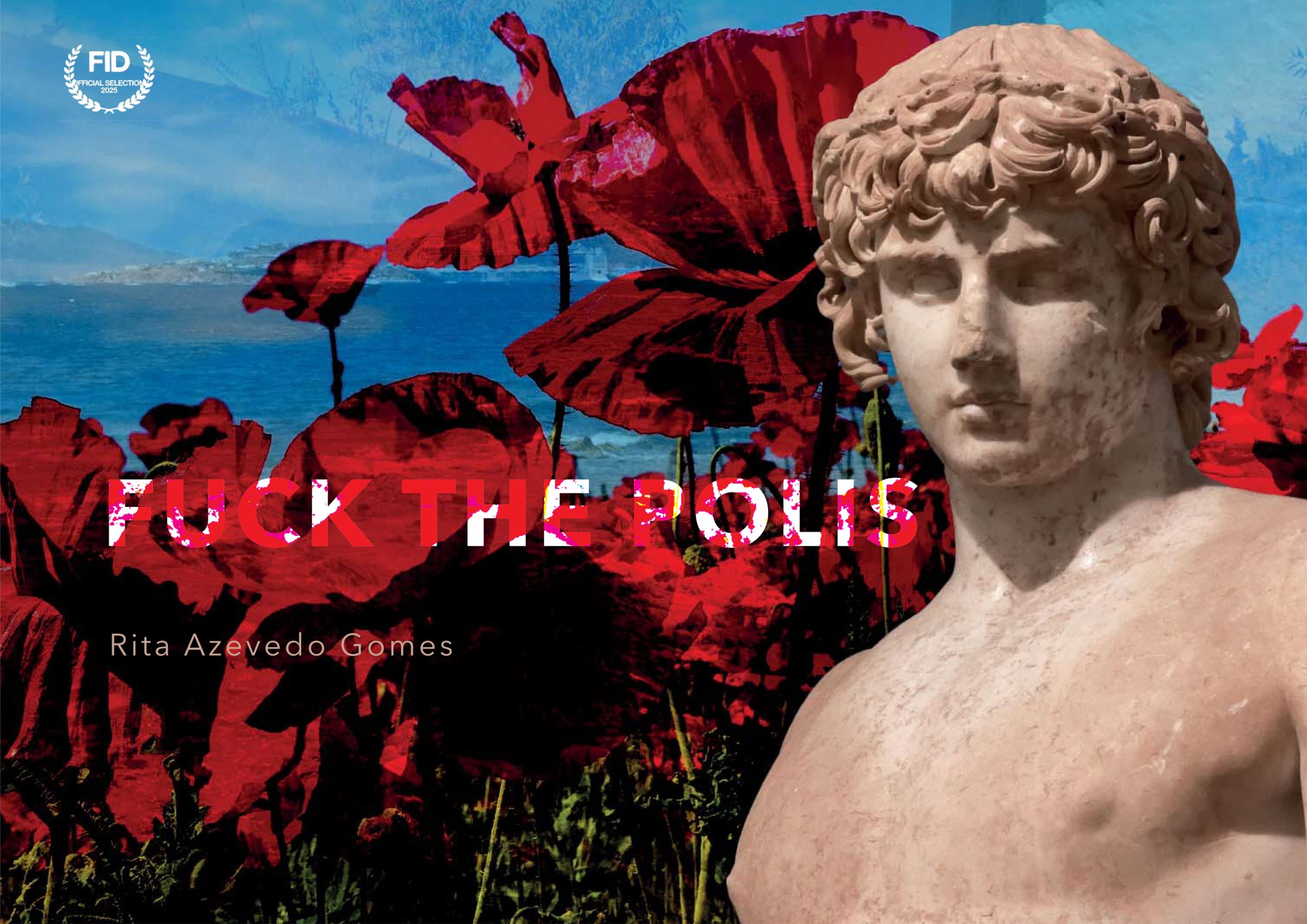감독 클라리사 나바스 Clarisa NAVAS | Argentina, Paraguay, Colombia, Germany | 2025 | 212min | Documentary
다큐멘터리는 과정, 변화, 그리고 삶을 기록하는 장르이다. 어떤 영화는 더 나아가 카메라가 기록하는 삶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클라리사 나바스 감독의 〈나나와의 왕자〉가 바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계기적이고, 우연적인 일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 클로린다에 면한 파라과이의 작은 마을, 나나와의 국경 시장에서 TV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클라리사 나바스는 대담함과 지성이 빛나는 아홉 살 소년 앙헬 스테그마이어를 만난다. 앙헬은 카메라 앞에서 모국어인 과라니어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옹호한다. “저는 파라과이 사람이고, 아르헨티나로부터 독립된 사람입니다.” 영민한 소년의 말은 영화감독과 주인공 사이의 돈독하고 심오하며 변화무쌍한 관계의 시작을 알렸다. 이 인상적인 만남을 계기로 프로젝트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화한다. 나바스는 앙헬과 그의 가족, 주변 환경, 끊임없는 이주,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형성된 지역의 변화를 추적하는 10년에 걸친 후속 작업을 이어갔다.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영화는 장르의 전형을 벗어나 촬영 그 자체에 대한 영화로 변모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인간들 사이의 가교이자, 때로는 단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광대한 이야기로 나아간다.
감독과 촬영 대상의 관계가 무르익어감에 따라 우리는 앙헬을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국경 지대에 사는 한 소년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발견할 수 있는 소년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게 된다. 〈나나와의 왕자〉는 시간과 지속 시간이라는 영화적 변수를 통해 이를 달성한다. 212분 분량의 영화 속에서 나바스는 인종, 계층 등의 차이에 무관하게 세계인들에게 공통된 성장의 단계들을 포착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최소 한 번씩 이루어진 촬영의 결과로 앙헬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그에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나바스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사건들이 이후 사건의 복선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대기적으로 따라간다. ‘소년’이라는 단어만 언급하면 본질을 흐릴 위험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영화의 의도인 것 같다. 현대의 소년성(남성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분명히 이 영화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두 부분으로 나뉜 서사는 먼저 앙헬의 어린 시절을 생생하고 혼란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 종종 앙헬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흐릿하고, 서툴지만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포착하는데, 그 이미지들은 감추는 것만큼이나 드러내는 것도 있다. 때로는 순진하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명석한 앙헬의 시선은 첫 번째 서사적 맥락을 구축한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즐거운 어린 시절, 놀이와 애정의 부재, 성장통, 그리고 가족의 비밀과 공존하는 시간을 기린다. 영화의 두 번째 부분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바뀐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이행기에 있는 앙헬에게 나바스는 더 이상 우호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팬데믹의 도래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를 잇는 다리의 폐쇄로 앙헬의 환경에도 균열이 생긴다. 시장은 문을 닫고, 비공식적인 노동이 늘어나며, 열다섯 살이 된 주인공의 내면적 긴장감 또한 커진다.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십 대 소년은 복잡한 인물이 되어 있다. 한때 말이 있던 자리에는 침묵이, 확신이 있던 자리에는 의심이 자리 잡는다. 그 와중에도 나바스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며, 앙헬은 그녀와 논쟁하고, 화를 내고, 동시에 그 또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피난처를 찾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카메라는 기록 장치를 넘어 연결의 도구가 된다.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하고, 경청하고, 동행한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끈기,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주인공의 감정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영화를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킨다.
이 영화에는 이미지가 재현을 넘어 ‘돌봄’이 되는 순간이 있다. 나바스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침범하지 않고, 기다리고, 망설이고, 서로에게 맞춰 숨을 쉰다. 사소한 범죄와 비행은 앙헬이 혼돈의 십 대 시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삶에 스며들고, 쾌활함은 주저함이나 변덕으로 바뀐다. 헬스장에서 부지런히 단련하는 소년의 몸에는 성적인 암시가 포함된 문신이 박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불안정한 팬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앙헬의 계급 정체성은 도전받게 되고, 성 역할에 대한 반동적인 입장을 갑작스레 마주하게 된다.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보이후드〉(2014)와의 비교가 불가피하지만, 〈나나와의 왕자〉는 솔직하고 급진적인 무언가를 보여준다. 미리 정해진 경로를 강요하지 않고 시간을 원재료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여기에는 폐쇄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 불완전한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다. 기술적 성취를 초월하여 앙헬의 삶에서 나바스가 쥐어준, 또는 기록하는 카메라의 존재는 감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이다. 영화가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임을 일깨워주는 〈나나와의 왕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빛나는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앙헬의 일상이 예상치 못한 사건과 드라마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따라가는 카메라는, 우연에 초점을 맞춘 예술 창조의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영화감독들이 주장하는 통제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클라리사 나바스는 순수함의 상실과 새로운 관점의 획득이라는 고전적인 비전을 포착하기 위해 경계에 서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경로를 타고, 그녀의 손에 자동적으로 쥐어진다.